노자 해설, 뜰 앞의 나무는 이름이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침묵'에 대하여
뜰 앞의 나무는 이름이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침묵'에 대하여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현묘함
1. 원문
도가도 비상도 (道可道 非常道) 명가명 비상명 (名可名 非常名) 무명 천지지시 (無名 天地之始) 유명 만물지모 (有名 萬物之母) 고상무욕이관기묘 (故常無欲以觀其妙) 상유욕이관기요 (常有欲以觀其徼) 차양자 동출이이명 (此兩者 同出而異名) 동위지현 (同謂之玄) 현지우현 (玄之又玄) 중묘지문 (衆妙之門)
2. 해석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불변한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것(無名)은 천지의 시작이요, 이름이 있는 것(有名)은 만물의 어머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늘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한 본질(妙)을 보게 되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난 껍데기(徼)만 보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나왔으되 이름만 달리 붙은 것이니, 이를 아울러 현묘(玄)하다 이릅니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이는 곧 모든 오묘함이 드나드는 문(門)입니다.
해설: 이름 없는 것들을 위하여
창밖 뜰에 서 있는 늙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저것을 '나무'라 부르고, 봄이면 피어나는 것을 '꽃'이라 이름 붙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도 그것들은 그저 그곳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리려는 것은, 이 광활하고 알 수 없는 우주를 우리의 작은 손바닥 안에 쥐어보려는 가련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자(老子)가 말한 '도(道)'란 결국 이러한 인위적인 구분 너머에 있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숨결 같은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름 속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나를 규정하는 직함,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판,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모습들... 그러한 '이름(名)'과 '욕심(欲)'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에, 우리는 정작 보아야 할 사물의 참된 모습, 그 그윽하고 오묘한 속살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 가장자리(徼), 즉 결과와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가슴을 서늘하게 두드립니다.
가끔은 마음의 눈을 감고, 내 안의 욕심을 가만히 내려놓아 봅니다. 내가 굳이 무엇이라 이름 짓지 않아도, 계절은 어김없이 오고 가며 뜰 앞의 풀잎은 저 혼자 푸릅니다. 그 '이름 없는(無名)'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천지가 시작되던 태초의 평온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깊어 잘 보이지 않기에 '현묘(玄)'하다고 했으나, 그 어둠은 캄캄한 절망이 아니라 만물을 잉태하는 자애로운 어둠일 것입니다.
벗이여, 오늘 하루는 세상이 당신에게 붙인 이름표를 잠시 떼어두는 것은 어떨까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욕심, 무언가로 불려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그저 스쳐 가는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존재해 보십시오.
현묘한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멈추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윽한 눈길로 바라볼 때, 세상 모든 평범한 것들이 실은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중묘지문(衆妙之門)'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것입니다. 잎새 하나가 흔들리는 것에서도 우주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 넉넉하고 고요한 마음,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로이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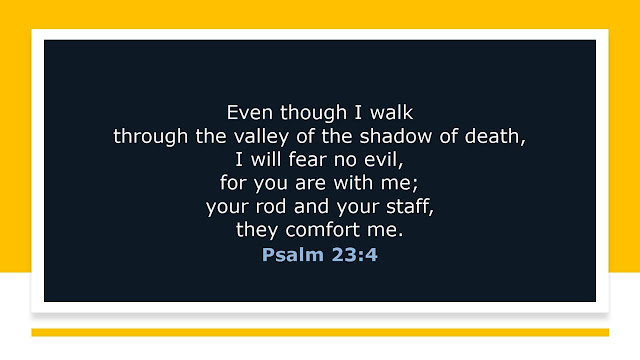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