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 해설, 머물지 않는 바람처럼: 빈 지게에 싣는 달빛
머물지 않는 바람처럼: 빈 지게에 싣는 달빛
머물지 않는 바람처럼
1. 원문과 독음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故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傾 音聞相和 前後相隨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萬物作焉 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不居 夫惟弗居 是以不居
천하개지미지위미 사악이 개지선지위선 사불선이 고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하상경 음문상화 전후상수 시이성인처무위지사 행불언지교 만물작언 이불사 생이불유 위이불시 공성이불거 부유불거 시이불거
2. 해석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알지만, 이는 (그에 반대되는)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모두가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알지만, 이는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므로 있음(有)과 없음(無)은 서로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주며, 길고 짧음은 서로 견주어지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어지며, 노래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의 일에 처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은 생겨나도 (성인은) 말 한마디 없이 주재하지 않으며, 낳으면서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위하면서도 뽐내지 않으며, 공을 이루어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대저 머물지 않으므로, (그 공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다.
빈 지게에 싣는 달빛
저기 산마루에 걸린 구름을 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다가, 이내 흩어져 버립니다. 구름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푸른 하늘이라는 빈 여백이 있어, 구름의 흰 자락이 눈부시게 드러날 뿐이지요.
노자(老子) 님께서 말씀하셨다지요. 세상이 모두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아름답다 여기는 순간, 이미 추한 것이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무릎을 치게 만드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늘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내가 더 곱다", "내가 더 낫다" 하며 키를 재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긴 것이 있어야 짧은 것이 드러나고, 높은 언덕이 있어야 낮은 골짜기가 패이는 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홀로 빛나려 아등바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아 붓을 들 때, 내 마음속에 '명문(名文)을 남기겠다'는 욕심이 들어차 있으면 붓끝은 뻣뻣해지고 글은 겉멋만 들게 됩니다. 그저 내 어머니가 흥얼거리시던 삼베 짜는 노래처럼, 혹은 경상도 투박한 사투리로 툭 던지는 "오냐, 밥 묵었나" 하는 인사처럼, 자연스럽고 무심해야 참된 맛이 우러나는 법이지요.
성인(聖人)은 '무위(無爲)'로 일을 한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꽃은 향기를 팔지 않고, 나무는 그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낳았으되 가지려 하지 않고(生而不有), 공을 이루었으되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功成而不居) 그 마음. 그것은 마치 자식을 기르되 보답을 바라지 않는 우리네 어머니의 거칠고 따뜻한 손길과도 닮았습니다. 절대자의 섭리 앞에 그저 고개 숙이고,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농부의 땀방울과도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 합니다. 잘 썼다는 칭찬에도, 못 썼다는 타박에도 머물지 않고 싶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스쳐 가는 바람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조차 비워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참된 평안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머물지 않아야 떠나가지 않는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따라 늙은 시인의 가슴을 서늘하게, 그러면서도 훈훈하게 어루만집니다.
빈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지게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등 뒤로 쏟아지는 달빛만은 가득합니다. 비어있으니 이토록 가득 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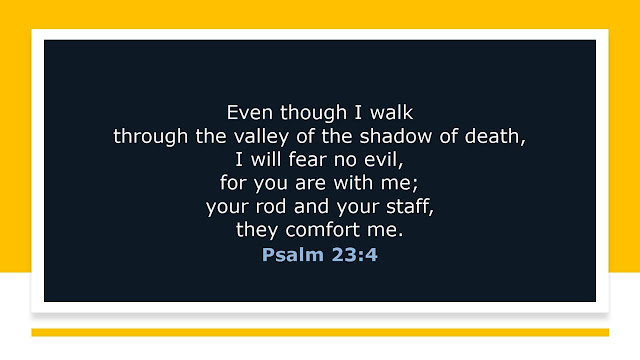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