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길 - 강길용 수필
"산길"은 자연 속에서 산소(山所)를 가꾸고 조상을 기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풀을 깎으며 조상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며, 산길을 걷는 동안 서로의 정을 나누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묘사한다.
산길
촉촉이 젖어 있는 길, 풋풋한 풀 냄새가 코끝 간지르는 길, 이곳이 길이라고 이정표도 없는 길, 그런 길이 깊은 숲 속으로 이어져 있다. 한 젊은이가 가끔 들리는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풀잎들이 발끝에 채이며 신발 위로 이슬방울을 흩뿌린다. 잠시 앉아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졌는지 멈추어 선다. 어깨에 매달린 풀 베는 기계가 두렵지도 않은지 풀들은 이야기 건네는 젊은이를 반긴다. 간간이 개울이 나타나서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 비춰진다.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잔잔한 소리로 노래하며 흐른다.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멀었던 산소가 눈에 들어온다. 그 어딘가에 혼이 젊은이를 반기고 있는 느낌이 든다. 발걸음을 더 빨리 움직여 다가간다. 언제 보았던가 싶을 정도로 낯선 산소 곁에 멈추어선 잠시 고개를 숙인다. 봉분 위로 이름 모를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다. 푸르게 자라던 시절 젊은이가 구르며 놀았던 잔디는 풀숲에 숨어 있다.
아니 생명을 조금씩 잃어 가고 있다. 조금씩, 그러나 쉬지 않고 번져 오는 잡초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요동치는 가슴, 떨리는 손길로 할아버지 산소로 다가간다. 그 위로 이슬방울이 차갑게 느껴진다. 마치 무덤 주인의 눈물 같다. 어쩌면 무심히 두고서 멀리 사라졌다가 일년에 단 한번 찾아오는 손자 녀석이 야속했을 법하다. 그래서 가슴을 흐르던 눈물을 이슬로 내뿜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심장의 뜀박질 소리가 들린다.
풀깎이에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건다. 요란한 엔진 소리가 사정없이 고막을 내갈긴다. 풀들이 놀라고, 메뚜기나 풀벌레들도 단잠에서 깨어나 이리저리 달아난다. 이리저리 휘둘러지는 풀깎이에 잘려져 나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수십 년 전 흙 속에 묻혀 흙이 되어 가고 있는 한 생명, 그 양분을 되받아 다시 살았던 풀들, 그들이 공존했던 시간은 그렇게 끝나 가고 있었다. 손길이 옮겨질 때마다 반듯이 깎여진 산소의 모습이 살아난다. 봉긋 솟아난 제 모양을 자랑하듯, 죽음 뒤에 찾은 할아버지의 집은 말끔히 다듬어졌다.
머리에 쑥스럽게 모자를 썼던 어느 '중학생의 까까머리'를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비추게 한다. 그 어느 것도 닮아 있질 않았다. 산소를 타며 놀았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산소에 넙죽 엎드려 담배를 말아 피우던 어린 아이, 술쭈꾸미를 먹고선 비틀거리는 몸을 쉬게 하려고 산소의 잔디밭을 찾았던 사내아이, 밤바람이 지르는 아우성이 무서워 집밖을 나서지 못하던 순박한 아이, 멀리 솟은 산봉우리에 오르고 싶어 혼자 떠났다가 길 잃어 울던 아이, 가제를 볶아 먹는 맛에 밤이면 형제들과 함께 횃불 들고 도랑을 훑던 아이, 물푸레 나뭇잎을 따 샘물을 마시던 아이, 싸리나무 숲에 숨어 울던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은 젊은이의 얼굴에도 몸에도 새겨져 있질 않았다. 단지 메마른 얼굴에 욕심을 채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온 흔적들이 까칠까칠한 수염으로 자라 있을 뿐이다.
할아버지 산소를 내려와 큰아버지 산소의 풀을 베며 또 같은 생각을 한다. 지렁이가 배설한 흙은 묘한 모습을 하고 가끔씩 풀깎이의 쇳날에 부닥치며 찢어지는 소리를 질러 댄다. 그럴 때면 깜짝깜짝 놀란 가슴과 손놀림이 멈춰진다. 그리곤 다시 풀베기를 시작한다. 젊은이의 느낌을 아는지 그의 아버지는 무심히 낫질을 하고 있다. 또 한 젊은이가 베어져 여기저기 나뒹구는 잔해를 말끔히 치우고 있다. 그의 동생이었다. 그는 형이 무슨 생각을 하며 풀을 베고 있는지를 알 턱이 없다. 다만 풀을 베어야 추석에 만날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잠깐씩 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부자(父子)는 술을 따르고 절을 한 뒤에 자리를 벗어나 길을 떠난다.
다시 산길이다.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슬은 모두 말라 풀잎은 푸석거린다. 바람이 간간이 불어와 땀을 식혀 준다. 할머니 산소에서 또 같은 의식을 되풀이한다. 되돌아 내려오면서 지나간 시절들을 이야기한다. 사이 좋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꾀꼬리 한 쌍이 하늘을 가로질러 건너편 산으로 날아갔다.
"저 놈의 꾀꼬리는 나는 재주가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형제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한낮의 햇살이 따갑게 얼굴과 몸을 향하여 달구고 있다. 산길은 나무 향기를 내 뿜으며 그들의 길을 열고 있다. 산길이 끝나는 곳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질 않는다. 그 속으로 정(情)이 야금야금 자라며 집까지 동행(同行)한다.
산길 거닐며 쌓았던 정을 모두 담아 두진 못하겠지만, 오래도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글을 쓰며 바라는 가장 큰 나의 소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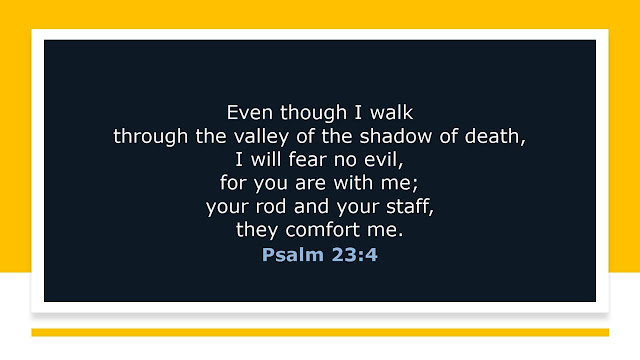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